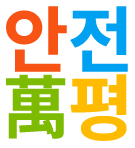
사망률과 이환율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M&M 콘퍼런스(Morbidity & Mortality Conference)"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 의료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회의는 사망률과 이환율(인구집단내 특정한 질환상태에 있는 비율)을 다루지만, 수술 후 감염이나 이상 반응과 같은 유해사례(Adverse events)를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보건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학습과제를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학습과 개선을 위해 부정적 리스크나 실패요인 등의 유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로 논의하는 회의이며, 이러한 경향은 의료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산업분야의 황금률처럼 동일(또는 유사)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피해예방에 관한 일반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습효과에 실제로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며 유해사례를 줄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미미한 상태에서 M&M 콘퍼런스의 혁신을 요구하는 내부 성찰이 일어났다. 이에 2016년 경부터는 실패사례나 부정요인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일(수술)이 잘 진행된 성공요인까지 추가하여 “통합적 관점"을 향상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정착되고 있다.
국내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산재사고 사망자 827명, 산재 관련 질병사망자 1271명으로 총 사망자 2098명을 기록했다. 이중 건설업 • 제조업 • 광업 등 세 산업의 사망자가 1422명으로 전체의 67%에 해당하며, 질병사망자의 35%인 446명이 광업분야에서 발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른 2024년 자살자는 14,439명으로 산재사망자보다 17배 이상 높은 비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서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 폭발, 질식) 및 폭염분야 12대 핵심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후진국형 사고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엄단하는 방침도 발표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1명만 발생해도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산업재해가 세 번 이상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면허까지 취소하는 입법도 논의 중이다. 위의 두 사례를 보면, M&M 콘퍼런스와 고용노동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전자는 결과적인 수치의 감소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반면, 후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학습과정 없이 결과적인 수치의 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발표내용도 살펴볼수록 의구심만 늘어난다. 건설사의 영업정지나 면허취소가 국민을 위한 안전대책인가? 건설 현장과 제조업의 사망자수는 유사하고, 산재 관련 질병사망자가 오히려 20% 이상 많지만 영업정지는 건설업에만 적용되는가? 매일 40여 명이 생을 마감하는 자살자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정부는 면책 사항에 해당되는가? 영업정지나 면허가 취소되는 건설사와 해당 관계사 임직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인간은 기계가 아니므로 규정만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업무 효율성의 이름으로, 때로는 생산성의 이유로, 또는 각자의 이익과 조직의 편리를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실무를 조정한다. 그러므로 규정과 현장의 실무 사이에는 항상 격차가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가 일이 잘되는 이유가 되며, 동시에 일이 잘못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규정에 맞는 현장이란 고정관념은 늘 강조되지만, 현장에 맞는 규정으로 수정할 다른 관점은 애초부터 준비되어 있지도 않다. 후진국형 事故는 후진국형 思考로부터 시작된다! RS+250823